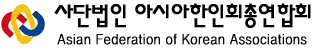[칼럼]엑스포는 ‘연결’이다, 문명의 조건은 ‘교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7-14 09:34본문
[칼럼]엑스포는 ‘연결’이다, 문명의 조건은 ‘교류’다
김기찬 인도네시아 프레지던트대학교 국제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2025 오사카 엑스포'에 등장한 '조선통신사'의 의미와 세종의 조선통신사 외교
- 김기찬 교수
- 입력 2025.07.09 23:19
- 수정 2025.07.09 23:34
- 댓글 0
 지난 6월27일 일본 오사카 앞바다에 도착한 조선통신사선 실물 복원본.
지난 6월27일 일본 오사카 앞바다에 도착한 조선통신사선 실물 복원본.  김기찬 프레지던트대학 국제총장
김기찬 프레지던트대학 국제총장세종의 유산, 조선통신사의 외교
2025 오사카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기술뿐 아니라, 세종과 이예가 남긴 문명 교류의 유산을 되살리는 시간이기도 했다.
2025년 6월 27일,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이 전례 없는 주목을 받았다. 이날, 누적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 한 척의 전통 배가 오사카 앞바다에 도착했다. 이 배는 무려 261년 전, 일본과의 마지막 공식 외교를 수행했던 조선통신사선의 실물 복원본이었다. 그리고 이 날은 우연히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리고 1764년 마지막 통신사 정박 이후 처음으로 오사카 해상에 조선통신사선이 재등장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한국관 앞에서는 통신사 복장을 한 배우가 “조선에서 왔습니다”라고 외쳤고, 대형 스크린에는 600년 전 통신사들의 여정이 몰입형 영상으로 재현되었다. 해양유산연구소와 민간 복원팀은 4년에 걸친 고증과 설계를 통해 실물 크기의 조선통신사선을 정교하게 복원했다.
이 배는 2023년 부산–쓰시마, 2024년 부산–시모노세키 항해를 거쳐 2025년 5월 13일, ‘한국의 날’에 맞춰 오사카 앞바다에 입항했다. 조선통신사선의 입항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척의 배가 바다를 건넌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 대화를 통해 국경을 건넌 사건이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위해 이곳에 왔다.”
–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 통신사 복장 배우의 첫 마디 중
세종대왕: 조선통신사 외교를 문명 창조의 도구로 활용한 리더
조선 전기의 외교 황금기는 단연 세종대왕(재위 1418~1450) 시기였다. 세종은 재위 32년 동안 총 7차례 통신사를 파견했으며, 이는 1404~1811년의 408년간 24회에 걸쳐 파견된 통신사 사행의 약 30%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어느 왕보다 통신사 외교에 집중한 왕이었다.
세종은 외교를 단순한 국방·안보의 도구로 보지 않았다. 그는 외교를 통해 조선의 하늘(천문), 시간(시계), 언어(훈민정음)을 창조했고, 외국의 기술·제도·문화를 수용하여 조선 문명을 재설계한 리더형 창조자였다.
“문명은 스스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교류 속에서 진화한다.”
– 『세종실록』 사절 파견 기록 해석
세종은 통신사를 통해 왜구 억제, 무역 협상, 문화 교류, 제도 학습까지 포괄했으며, 오늘날로 치면 통상 외교, 공공 외교, 인도적 외교, 기술 벤치마킹 외교를 결합한 복합형 외교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리고 1764년 마지막 통신사 정박 이후 처음으로 일본 오사카 해상에 조선통신사선이 재등장한 역사적 순간이 펼쳐졌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리고 1764년 마지막 통신사 정박 이후 처음으로 일본 오사카 해상에 조선통신사선이 재등장한 역사적 순간이 펼쳐졌다.조선통신사: 408년간 지속된 평화외교의 상징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공식 문화외교 사절단으로, 1404년 태종 대 제1차 파견을 시작으로, 1811년 순조 대 제24차 파견까지 무려 408년간 유지된 평화외교 시스템이었다. 이 제도는 동아시아 외교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국가 간 신뢰가 제도화되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조선은 외교 전략에서 명나라와는 조공 체제, 일본과는 ‘교린외교’(이웃 나라 간 대등한 관계)라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했다. 이는 조선이 단순한 피동적 외교 국가가 아닌, 자율적·능동적 문명국가로서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예(李藝): 신뢰로 다리를 놓은 조선의 글로벌 외교관
세종 외교의 실천가이자 대표적 통신사 외교관은 이예(1373~1445)였다. 그는 세종의 명을 받아 총 4차례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일본 전역을 40회 이상 순회했고, 납치된 조선인 667명을 구조하여 귀국시킨 인도적 이상을 바탕으로 한 공감 기반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일본 막부와의 긴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며, 오랜 적대와 불신을 예(禮)와 신의(信義)로 회복시켰다.
『세종실록』은 그를 “신뢰를 가져온 외교의 영웅”으로 기록했다.
일본 사절단과의 교류 과정에서 이예는 단 한 번도 전쟁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사람의 말을 통해 마음을 나눈다”고 말했다. 이예는 단지 외교관이 아닌, 인문학자이자 문화 교류자였으며, 오늘날로 치면 문화외교관, 글로벌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휴먼 브랜드 전략가에 해당한다.
 누적 관람객수 100만명을 돌파한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의 문화행사 모습.
누적 관람객수 100만명을 돌파한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의 문화행사 모습. 외교로 얻은 문명: 통신사는 정책의 플랫폼이었다
조선의 통신사들은 단순히 외교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일본의 경제, 행정, 화폐, 도량형, 교육, 기술, 종교, 예술 등을 세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국제 정보 수집 보고관(Intelligence Delegation)이었다.
특히 정사 박서생과 부사 이예의 1428년 통신사 사행의 결과로 제출한 통신사 보고서에는, “일본은 천 리(千里)를 가도 화폐만 있으면 상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실렸고, 선세(船稅)를 화폐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보고는 훗날 상평통보 도입, 전납세제 정비, 도량형 통일 등 조선 후기 경제 시스템 개혁의 기초가 되었다. 즉, 통신사는 정치 외교만이 아닌, 경제와 제도의 개혁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이기도 했던 것이다.
단절이 초래한 비극 – 외교의 부재가 전쟁을 부른다
세종 전후 50년간은 4년에 한 번 꼴로 통신사를 보낼 정도로 양국 외교가 활발했다.그러나 그 후 조선은 국정 혼란과 함께 외교를 소홀히 하면서 150년 동안 통신사가 한번도 일본 땅을 밟지 않을 정도로 공식 외교가 급감했다.
그 결과 양국 간 정보는 단절되었고, 상호 이해도도 급격히 낮아졌다. 이 흐름은 결국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으로 귀결된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조선은 국가 기반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이 비극은 ‘외교 중단 → 정보 단절 → 위기 감지 실패 → 전쟁’이라는 구조적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역사는 말한다. 문명을 지탱하는 것은 대화이며, 평화를 지키는 것은 교류라는 사실을.
결론: 문명은 연결이다
2025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았다. 문명은 혼자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엑스포는 더 이상 기술의 경쟁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철학과 철학이 만나고, 국경을 넘어 ‘함께’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리였다.
261년 전, 마지막 조선통신사선이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위해 이곳에 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