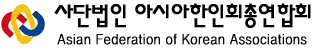[우리말로 깨닫다] 이름과 문화번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2-02 10:03본문
[우리말로 깨닫다] 이름과 문화번역
- 조현용 교수
- 입력 2024.12.01 15:18
- 댓글 0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물론 같은 이름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은 하나뿐이고 그래서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유명사에는 크게 사람의 이름과 지명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대로 문화적인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에디슨이라고 하면 발명가가 되고,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면 봉사와 헌신의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테레사 수녀나 간디 등도 문화적인 이름입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이 상징하는 바가 있고, 서울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평양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감정이 다를 겁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명, 지명으로 생각하고 번역해서는 올바른 번역이 될 수 없고, 원어의 맛을 살리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어를 번역할 때 이름은 한국인의 사고와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한국인의 이름이나 성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어에는 내가 성을 갈겠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여도 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같은 성으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성을 바꾸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영어의 패밀리 네임이라는 말이 한국어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어에서도 가족은 같은 성을 공유합니다. 한국 이름에는 돌림자가 있는 것도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돌림자에 의해서 아저씨뻘, 할아버지뻘, 손자뻘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이보다 촌수에 의한 구별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인물의 경우도 인식이 다릅니다. 이완용 같다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완용은 한국의 가장 유명한 친일파이고, 매국노이기 때문에 심각한 욕이 됩니다. 이완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사임당이 의미하는 바와 유관순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율곡이나 퇴계 선생은 한국 지폐에서도 만날 수 있는 철학자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돈에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국의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 조선시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신사임당 이전까지는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사임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씨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조선시대 이 씨 남자만 지폐 속의 인물이었다니 말입니다. 저는 지폐의 인물도 다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군 할아버지부터 선덕여왕 등 수많은 역사적 인물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할 겁니다.
케이 콘텐츠의 인물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수와 배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수로서의 이름과 배우로서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보통은 배우일 때 본명을 쓰기도 합니다. 특이한 현상입니다. 요즘 가수들의 경우는 성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생각거리를 줍니다. 예전에는 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제는 성이라는 성에 갇혀있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전의 연예인은 예명을 쓰더라도 성은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원래 성이 아닌 경우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지명의 경우는 한국인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푸른 밤이라고 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지리산의 느낌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해방 후의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은 이해하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전주라는 도시가 상징하는 모습과 경주라는 도시가 상징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해운대나 광안리의 느낌과 여수 밤바다의 느낌이 다릅니다. 수많은 노래와 드라마, 영화에 지명이 등장합니다. 지명에 담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번역이 어려울 겁니다.
인명이나 지명은 그대로 문화입니다. 때로는 역사 속의 문화이기도 하고 케이 콘텐츠 속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담긴 다양한 문화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번역의 첫걸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나이를 추측하고, 우리는 어느 지역의 이름만 들어도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름은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어휘인 셈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