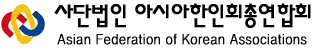[아! 대한민국-238] 김과 멸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4-12-02 09:56본문
 김정남(본지 고문, 전 청와대 사회교육문화수석)
김정남(본지 고문, 전 청와대 사회교육문화수석)한류 열풍이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K-음식도 이제 세계인의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다. 한국인에게 익숙한 음식으로 김과 멸치가 있다. K푸드가 세계인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것의 원류가 자기 민족에게 있다면서 종주권을 주장하는 경향이 밖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안으로 그 음식이 어떻게 우리의 국민음식이 되었는지 그 연원이나 역사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 일상생활, 특히 식(食)문화에서 아주 익숙한 김과 멸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김은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로 미역, 다시마, 우뭇가사리, 파래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다. 신석기 시대, 부산 범방동 수가리 패총을 보면 ‘고분띠 무륵’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민족은 적어도 5000~6000년 전부터 해조류를 돌이나 바위에서 뜯어먹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나 ‘본초습유’ 등의 기록으로 볼 때 일찍부터 우리 민족은 김이나 미역 등을 뜯어 먹었다. 구개음화가 많이 진행된 남부지방에서는 김을 ‘짐’이라고 불렀다. 우리 글이 없었던 시절에는 김을 한자로 표기할 때 주로 ‘해의(海衣)’로 표기했고, 정약전 같은 사람은 ‘김’의 소리를 빌려 ‘짐(朕)’이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김은 반찬으로 매우 훌륭했다. 물론 처음에는 김을 건져서 바로 무쳐 반찬(김 자반)으로 먹었겠지만, 김을 건지거나 뜯어 돌에 넓적하게 펴서 말리면 매우 부드럽고 끊어지지 않는 쌈 종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여수 앞바다 금오도에는 오래전부터 김을 말렸다는 넓적바위가 있다. 우리 민족처럼 밥과 반찬을 싸서 먹는 음식문화가 발달한 민족에게 김은 매우 훌륭한 쌈 재료다. 중국의 밀가루로 만든 만두피, 베트남의 쌀로 만든 쌀종이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 ‘쌈 문화’가 발전해 K푸드 김밥이 탄생한 것이다. 일본은 김을 쌈 재료로서가 아니라 스시에 얹어 먹는 문화다.
멸치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선이다. 한국인의 기본 반찬인 김치를 담글 때는 물론이고 다양한 음식의 국물을 만들 때 두루 쓰인다. 삶아 말린 것을 볶아서 먹거나 찜 같은 음식에 부재료로 넣기도 한다. 멸치가 많이 잡히는 바닷가 마을에서 맛보는 회무침 또한 뭇 사람의 입안에 군침이 돌게 한다.
이렇듯 한국인이라면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는 게 멸치이지만 사실 멸치가 우리 밥상을 점령한 세월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멸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별로 가치가 없어 ‘업신여길 멸(蔑)자’를 써서 멸어라고 부른다”고 했다. 또 급한 성질 탓에 밖으로 나오면 금방 죽는다는 의미에서 ‘멸할 멸(滅)’자를 쓰기도 한다고 했다. 다만 우리 바다에서 워낙 많이 잡혀 일반 백성이 그나마 쉽게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옛 문헌에 나온다.
멸치가 우리 식생활에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다. 불교의 영향으로 육고기를 멀리한 일본에서는 생선으로 육수를 만들어 썼는데 이것이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 빠르게 퍼져 나간 것이다. 이렇게 멸치는 빠른 시일 안에 가장 중요한 어족자원이 됐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해 물러가면서 멸치 어업은 위기를 맞았다. 이때 새 활로가 된 것이 우리 군대였다. 값싸고 영양분 많은 멸치는 군대 식량으로 제격이었다. 이후 6.25전쟁으로 삶이 황폐해진 서민들 사이에서는 멸치가 유용한 먹거리로 자리잡으면서 이제 ‘국민 생선’이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